%EB%A9%B4%EC%97%AD%EC%84%B8%ED%8F%AC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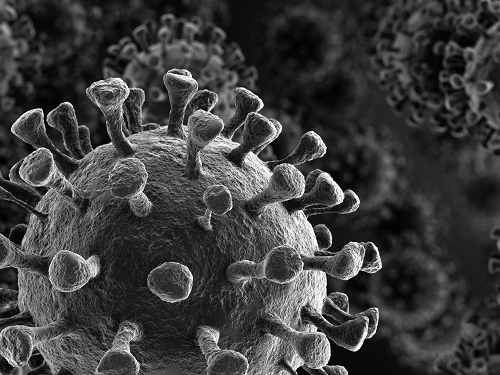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사이토카인 폭풍 원인 찾았다
우리 대학 의과학대학원 신의철 교수와 생명과학과 정인경 교수 연구팀이 서울아산병원 김성한 교수·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최준용·안진영 교수, 충북대병원 정혜원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중증 코로나19 환자에서 나타나는 과잉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을 발견했다.
과잉 염증반응이란 흔히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도 불리는 증상인데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cytokine)이 과다하게 분비돼 이 물질이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현상이다.
☞ 사이토카인(cytokine): 면역세포로부터 분비되는 단백질 면역조절제로서 자가분비형 신호전달(autocrine signaling), 측분비 신호전달(paracrine signaling), 내분비 신호전달(endocrine signaling) 과정에서 특정 수용체와 결합하여 면역반응에 관여한다. 세포의 증식, 분화, 세포사멸 또는 상처 치료 등에 관여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이토카인이 존재하며, 특히 면역과 염증에 관여하는 것이 많다. 세포를 의미하는 접두어인 ‘cyto’와 그리스어로 ‘움직이다’를 의미하는 ‘kinein’으로부터 cytokine이 명명됐다.
☞ 사이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 인체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였을 때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현상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1,300만 명 이상이 감염됐고 이 중 5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은 경증 질환만을 앓고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으나, 어떤 환자들은 중증 질환으로 발전해 심한 경우 사망하기도 한다. 흔히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에 중증 코로나19가 유발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과잉 염증반응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도 알려지지 않아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대학 의과학대학원 이정석 연구원 및 생명과학과 박성완 연구원이 주도한 이번 연구에서 공동연구팀은 중증 및 경증 코로나19 환자로부터 혈액을 얻은 후 면역세포들을 분리하고 단일 세포 유전자발현 분석이라는 최신 연구기법을 적용해 그 특성을 상세히 분석했다. 그 결과, 중증 또는 경증을 막론하고 코로나19 환자의 면역세포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일종인 종양괴사인자(TNF)와 인터류킨-1(IL-1)이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특히 중증과 경증 환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인터페론이라는 사이토카인 반응이 중증 환자에게서만 특징적으로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 인터페론(interferon): 사이토카인(cytokine)의 일종으로 숙주 세포가 바이러스, 세균, 기생균 등 다양한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혹은 암세포 존재 하에서 합성되고 분비되는 당단백질이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서 분비되는 제 1형 인터페론이 많이 알려져 있으며 주변 세포들이 항바이러스 방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돕는다.
지금까지 인터페론은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착한(?)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동연구팀은 인터페론 반응이 코로나19 환자에서는 오히려 과도한 염증반응을 촉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증명했다.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과 서경배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공동연구팀의 이번 연구결과는 면역학 분야 국제 학술지인 사이언스 면역학(Science Immunology)誌 7월 10일 字에 게재됐다(논문명: Immunophenotyping of COVID-19 and Influenza Highlights the Role of Type I Interferons in Development of Severe COVID-19).
연구팀은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과잉 염증반응 완화를 위해 현재에는 스테로이드제와 같은 비특이적 항염증 약물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연구 성과를 계기로 인터페론을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치료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중증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획기적인 연구라고 이 연구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관련 학계와 의료계에서도 코로나19의 재확산 등 팬데믹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KAIST와 대학병원 연구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코로나19의 면역학적 원리를 밝히고 새로운 치료전략을 제시한 이번 연구를 중개 연구(translational research)의 주요 성과로 높게 평가했다.
공동연구팀은 현재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과잉 염증반응을 완화해 환자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약물을 시험관 내에서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발굴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후속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이정석 연구원은 내과 전문의로서 의과학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데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의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인경 교수 연구팀과 함께 이번 연구를 긴박하게 시작했는데 서울아산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충북대병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불과 3개월 만에 마칠 수 있게 됐다ˮ고 말했다.
정인경 교수는 "코로나19와 같은 신규 질환의 특성을 신속하게 규명하는데 있어 최신 단일세포 전사체 빅데이터 분석법이 매우 효과적ˮ이었음을 밝혔다.
신의철 교수도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환자의 면역세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세히 연구함으로써 향후 치료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연구ˮ라고 평가했다.
신의철 교수와 정인경 교수는 이와 함께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면역기전 연구 및 환자 맞춤 항염증 약물 사용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ˮ이라고 강조했다.
2020.07.14 조회수 33474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사이토카인 폭풍 원인 찾았다
우리 대학 의과학대학원 신의철 교수와 생명과학과 정인경 교수 연구팀이 서울아산병원 김성한 교수·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최준용·안진영 교수, 충북대병원 정혜원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중증 코로나19 환자에서 나타나는 과잉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을 발견했다.
과잉 염증반응이란 흔히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도 불리는 증상인데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cytokine)이 과다하게 분비돼 이 물질이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현상이다.
☞ 사이토카인(cytokine): 면역세포로부터 분비되는 단백질 면역조절제로서 자가분비형 신호전달(autocrine signaling), 측분비 신호전달(paracrine signaling), 내분비 신호전달(endocrine signaling) 과정에서 특정 수용체와 결합하여 면역반응에 관여한다. 세포의 증식, 분화, 세포사멸 또는 상처 치료 등에 관여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이토카인이 존재하며, 특히 면역과 염증에 관여하는 것이 많다. 세포를 의미하는 접두어인 ‘cyto’와 그리스어로 ‘움직이다’를 의미하는 ‘kinein’으로부터 cytokine이 명명됐다.
☞ 사이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 인체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였을 때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현상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1,300만 명 이상이 감염됐고 이 중 5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은 경증 질환만을 앓고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으나, 어떤 환자들은 중증 질환으로 발전해 심한 경우 사망하기도 한다. 흔히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에 중증 코로나19가 유발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과잉 염증반응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도 알려지지 않아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대학 의과학대학원 이정석 연구원 및 생명과학과 박성완 연구원이 주도한 이번 연구에서 공동연구팀은 중증 및 경증 코로나19 환자로부터 혈액을 얻은 후 면역세포들을 분리하고 단일 세포 유전자발현 분석이라는 최신 연구기법을 적용해 그 특성을 상세히 분석했다. 그 결과, 중증 또는 경증을 막론하고 코로나19 환자의 면역세포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일종인 종양괴사인자(TNF)와 인터류킨-1(IL-1)이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특히 중증과 경증 환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인터페론이라는 사이토카인 반응이 중증 환자에게서만 특징적으로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 인터페론(interferon): 사이토카인(cytokine)의 일종으로 숙주 세포가 바이러스, 세균, 기생균 등 다양한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혹은 암세포 존재 하에서 합성되고 분비되는 당단백질이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서 분비되는 제 1형 인터페론이 많이 알려져 있으며 주변 세포들이 항바이러스 방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돕는다.
지금까지 인터페론은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착한(?)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동연구팀은 인터페론 반응이 코로나19 환자에서는 오히려 과도한 염증반응을 촉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증명했다.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과 서경배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공동연구팀의 이번 연구결과는 면역학 분야 국제 학술지인 사이언스 면역학(Science Immunology)誌 7월 10일 字에 게재됐다(논문명: Immunophenotyping of COVID-19 and Influenza Highlights the Role of Type I Interferons in Development of Severe COVID-19).
연구팀은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과잉 염증반응 완화를 위해 현재에는 스테로이드제와 같은 비특이적 항염증 약물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연구 성과를 계기로 인터페론을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치료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중증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획기적인 연구라고 이 연구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관련 학계와 의료계에서도 코로나19의 재확산 등 팬데믹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KAIST와 대학병원 연구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코로나19의 면역학적 원리를 밝히고 새로운 치료전략을 제시한 이번 연구를 중개 연구(translational research)의 주요 성과로 높게 평가했다.
공동연구팀은 현재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과잉 염증반응을 완화해 환자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약물을 시험관 내에서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발굴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후속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이정석 연구원은 내과 전문의로서 의과학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데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의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인경 교수 연구팀과 함께 이번 연구를 긴박하게 시작했는데 서울아산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충북대병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불과 3개월 만에 마칠 수 있게 됐다ˮ고 말했다.
정인경 교수는 "코로나19와 같은 신규 질환의 특성을 신속하게 규명하는데 있어 최신 단일세포 전사체 빅데이터 분석법이 매우 효과적ˮ이었음을 밝혔다.
신의철 교수도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환자의 면역세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세히 연구함으로써 향후 치료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연구ˮ라고 평가했다.
신의철 교수와 정인경 교수는 이와 함께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면역기전 연구 및 환자 맞춤 항염증 약물 사용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ˮ이라고 강조했다.
2020.07.14 조회수 33474 -
 박수형 교수, 간암 복합면역치료 적용 가능성 확인
〈 박 수 형 교수 〉
우리 대학 의과학대학원 박수형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황신, 송기원 교수 공동연구팀이 간암 환자의 탈진(exhausted)된 종양 침투 면역세포 구성의 차이에 따른 간암 환자군을 구분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간암 환자의 새로운 면역치료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맞춤 의학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연구는 서울아산병원 임상 연구팀과 KAIST 의과학대학원이 동물 모델이 아닌 임상을 통해 새 면역 항암 치료법을 위한 협업을 진행한 것으로 중개 연구(translational research)의 우수 모델로 평가받는다.
김형돈 박사과정이 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소화기학(Gastroenterology)’ 12월 4일 자에 게재됐다.
암이 발생하면 인체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면역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하는데, 종양은 T세포의 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환경을 구성한다. 이때 침투한 T세포들은 ‘피디-1(PD-1)’ 단백질과 같은 면역 관문 수용체를 세포 표면에 발현하면서 활성이 저하되고 탈진된 상태가 된다.
‘PD-1 억제제’로 대표되는 면역 관문 억제제는 PD-1 신호에 의해 저하된 T세포의 활성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암세포는 생존을 위해 면역세포로부터 몸을 숨기는데, 면역 관문 억제제는 암세포가 숨는 데 도움을 주는 PD-1, PD-L1의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면역세포가 정상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면역 관문 억제제는 약 2~30%의 환자에게만 효능이 있고 70% 이상의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어 면역항암제의 치료 효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연구팀은 간암 환자의 탈진한 T세포 중에서 PD-1 단백질을 많이 발현하는 T세포가 그렇지 않은 T세포에 비해 면역세포의 기능이 더 많이 저하돼 있고, PD-1 이외의 다양한 면역 관문 수용체를 동시에 발현하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간암 환자 중에서 약 절반 정도의 환자만이 PD-1을 많이 발현하는 탈진 T세포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환자들이 복합 면역 관문 억제제에 의해 T세포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회복됨을 확인했다.
이번 결과를 통해 복합 면역 관문 억제제의 대상이 되는 환자군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면역 치료를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교수는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환자군은 현재 적용 중인 면역 관문 억제제 치료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 마커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며 “복합 면역 관문 억제제가 특정 환자에게만 효능이 있음을 제시해 맞춤 의학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임상적 의의를 갖는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첨단의료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 그림 설명
그림1. PD-1 발현에 따른 각 세포군의 특징적인 유전자 발현 양상
그림2. PD-1을 과발현하는 세포군의 존재 유무에 따른 특징적인 두가지 환자군
2018.12.12 조회수 10821
박수형 교수, 간암 복합면역치료 적용 가능성 확인
〈 박 수 형 교수 〉
우리 대학 의과학대학원 박수형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황신, 송기원 교수 공동연구팀이 간암 환자의 탈진(exhausted)된 종양 침투 면역세포 구성의 차이에 따른 간암 환자군을 구분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간암 환자의 새로운 면역치료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맞춤 의학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연구는 서울아산병원 임상 연구팀과 KAIST 의과학대학원이 동물 모델이 아닌 임상을 통해 새 면역 항암 치료법을 위한 협업을 진행한 것으로 중개 연구(translational research)의 우수 모델로 평가받는다.
김형돈 박사과정이 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소화기학(Gastroenterology)’ 12월 4일 자에 게재됐다.
암이 발생하면 인체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면역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하는데, 종양은 T세포의 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환경을 구성한다. 이때 침투한 T세포들은 ‘피디-1(PD-1)’ 단백질과 같은 면역 관문 수용체를 세포 표면에 발현하면서 활성이 저하되고 탈진된 상태가 된다.
‘PD-1 억제제’로 대표되는 면역 관문 억제제는 PD-1 신호에 의해 저하된 T세포의 활성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암세포는 생존을 위해 면역세포로부터 몸을 숨기는데, 면역 관문 억제제는 암세포가 숨는 데 도움을 주는 PD-1, PD-L1의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면역세포가 정상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면역 관문 억제제는 약 2~30%의 환자에게만 효능이 있고 70% 이상의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어 면역항암제의 치료 효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연구팀은 간암 환자의 탈진한 T세포 중에서 PD-1 단백질을 많이 발현하는 T세포가 그렇지 않은 T세포에 비해 면역세포의 기능이 더 많이 저하돼 있고, PD-1 이외의 다양한 면역 관문 수용체를 동시에 발현하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간암 환자 중에서 약 절반 정도의 환자만이 PD-1을 많이 발현하는 탈진 T세포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환자들이 복합 면역 관문 억제제에 의해 T세포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회복됨을 확인했다.
이번 결과를 통해 복합 면역 관문 억제제의 대상이 되는 환자군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면역 치료를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교수는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환자군은 현재 적용 중인 면역 관문 억제제 치료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 마커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며 “복합 면역 관문 억제제가 특정 환자에게만 효능이 있음을 제시해 맞춤 의학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임상적 의의를 갖는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첨단의료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 그림 설명
그림1. PD-1 발현에 따른 각 세포군의 특징적인 유전자 발현 양상
그림2. PD-1을 과발현하는 세포군의 존재 유무에 따른 특징적인 두가지 환자군
2018.12.12 조회수 10821 -
 신의철, 박수형 교수, 방관자 면역세포의 인체 손상 원리 발견
우리 대학 의과학대학원 신의철, 박수형 교수, 중앙대학교병원 김형준, 이현웅 교수 공동 연구팀이 바이러스 질환에서 방관자 면역세포에 의해 인체 조직이 손상되는 과정을 발견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바이러스 질환, 면역 질환이 인체를 손상시키는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신약 개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면역학 분야 국제 학술지 ‘이뮤니티(Immunity)’ 1월자 최신호에 게재됐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바이러스 증식 자체로 인해 인체 세포가 파괴되지만, 바이러스가 증식해도 직접적으로 인체 세포를 파괴하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인체 조직은 손상돼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원인이나 과정은 상세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이와 같은 현상이 잘 발생한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었다.
면역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특이성(specificity)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해당 바이러스에 특이적인 면역세포만 활성화돼 작동을 하고 다른 바이러스들에 특이적인 면역세포들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감염된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바이러스와 관련된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은 흔히 ‘방관자 면역세포의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오래 전부터 알려진 현상이다. 하지만 이 현상의 의학적 의미는 불투명했다.
공동 연구팀은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해당 바이러스에 특이적인 면역세포뿐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에 특이적인 엉뚱한 면역세포들까지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고 이러한 엉뚱한 면역세포에 의해 간 조직이 손상되고 간염이 유발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의 발견은 방관자 면역세포가 인체 손상을 일으키는 데 관여한다는 점을 규명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번 발견의 핵심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감염된 인체 조직에서 과다하게 생성되는 면역 사이토카인 물질인 IL-15가 방관자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면역세포들은 NKG2D 및 NKp30이라는 수용체를 통해 인체 세포들을 무작위로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IL-15 사이토카인, NKG2D, NKp30 수용체와 결합하는 항체 치료제를 신약 개발하면 바이러스 및 면역 질환에서 발생하는 인체 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연구는 중앙대학교 병원 임상 연구팀과 KAIST 의과학대학원이 동물 모델이 아닌 인체에서 새로운 면역학적 원리를 직접 밝히기 위해 협동 연구를 한 것으로 중개 연구(translational research)의 주요 성과이다.
신 교수는 “면역학에서 불투명했던 방관자 면역세포 활성화의 의학적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 첫 연구사례이다”며 “향후 바이러스 질환 및 면역질환의 인체 손상을 막기 위한 치료제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 그림 설명
그림1. 방관자 면역세포에 의한 인체 손상 과정 개념도
2018.02.21 조회수 18988
신의철, 박수형 교수, 방관자 면역세포의 인체 손상 원리 발견
우리 대학 의과학대학원 신의철, 박수형 교수, 중앙대학교병원 김형준, 이현웅 교수 공동 연구팀이 바이러스 질환에서 방관자 면역세포에 의해 인체 조직이 손상되는 과정을 발견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바이러스 질환, 면역 질환이 인체를 손상시키는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신약 개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면역학 분야 국제 학술지 ‘이뮤니티(Immunity)’ 1월자 최신호에 게재됐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바이러스 증식 자체로 인해 인체 세포가 파괴되지만, 바이러스가 증식해도 직접적으로 인체 세포를 파괴하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인체 조직은 손상돼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원인이나 과정은 상세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이와 같은 현상이 잘 발생한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었다.
면역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특이성(specificity)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해당 바이러스에 특이적인 면역세포만 활성화돼 작동을 하고 다른 바이러스들에 특이적인 면역세포들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감염된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바이러스와 관련된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은 흔히 ‘방관자 면역세포의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오래 전부터 알려진 현상이다. 하지만 이 현상의 의학적 의미는 불투명했다.
공동 연구팀은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해당 바이러스에 특이적인 면역세포뿐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에 특이적인 엉뚱한 면역세포들까지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고 이러한 엉뚱한 면역세포에 의해 간 조직이 손상되고 간염이 유발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의 발견은 방관자 면역세포가 인체 손상을 일으키는 데 관여한다는 점을 규명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이번 발견의 핵심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감염된 인체 조직에서 과다하게 생성되는 면역 사이토카인 물질인 IL-15가 방관자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면역세포들은 NKG2D 및 NKp30이라는 수용체를 통해 인체 세포들을 무작위로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IL-15 사이토카인, NKG2D, NKp30 수용체와 결합하는 항체 치료제를 신약 개발하면 바이러스 및 면역 질환에서 발생하는 인체 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연구는 중앙대학교 병원 임상 연구팀과 KAIST 의과학대학원이 동물 모델이 아닌 인체에서 새로운 면역학적 원리를 직접 밝히기 위해 협동 연구를 한 것으로 중개 연구(translational research)의 주요 성과이다.
신 교수는 “면역학에서 불투명했던 방관자 면역세포 활성화의 의학적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 첫 연구사례이다”며 “향후 바이러스 질환 및 면역질환의 인체 손상을 막기 위한 치료제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 그림 설명
그림1. 방관자 면역세포에 의한 인체 손상 과정 개념도
2018.02.21 조회수 18988